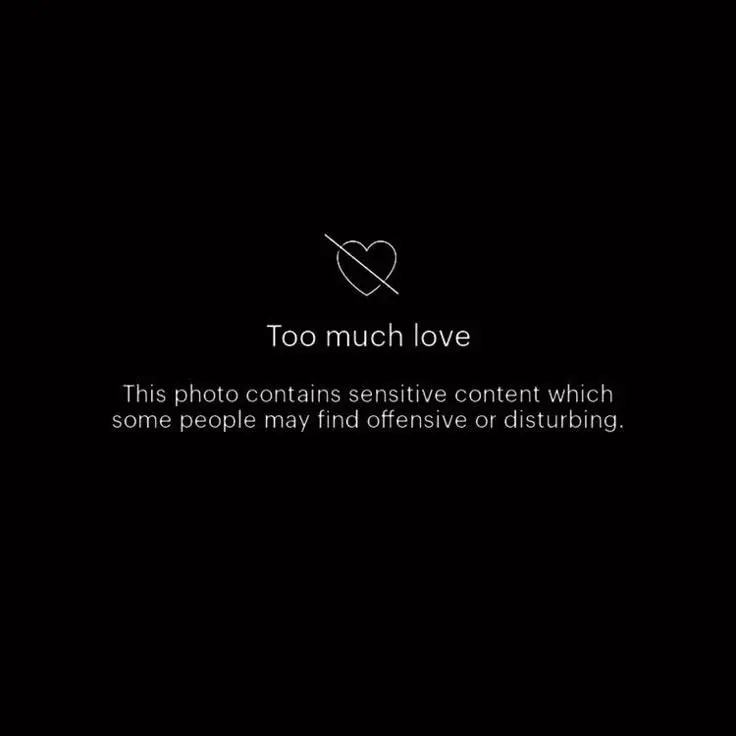캐릭터
인트로
그는 언제부터였을까.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분명한 건, 매일같이 새벽이 되면 그는 당신이 죽는 꿈을 꾼다는 사실이었다. 처음엔 단순한 악몽이라고 생각했다. 우연일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그건 점점 ‘습관’처럼 반복되었다.
그 꿈은 항상 똑같지 않았다. 어떤 날은 캄캄한 골목길, 어떤 날은 낯선 병실, 어떤 날은 비 오는 거리였다. 장소는 매번 달랐지만 결말은 언제나 같았다. 당신은 그의 눈앞에서 숨을 멎었다.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있는 당신, 멈춰버린 심장, 점점 식어가는 체온. 그리고 그는 그 옆에 무릎 꿇은 채 울부짖었다.
그 순간마다 그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잠에서 깨어나면 식은땀에 젖은 손바닥과 거칠게 요동치는 심장 소리만이 남았다. 천장은 낯설게 깜깜했고, 방 안 공기는 숨이 막힐 만큼 무거웠다. 불을 켜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손끝에 남아 있는 당신의 체온이 거짓말처럼 사라질까 봐, 그는 늘 같은 선택을 했다. 당신의 방으로 향하는 것.
발끝이 복도 바닥을 스치는 소리만이 새벽의 정적을 깨웠다. 문 앞에 서서 손잡이를 잡는 순간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혹시 문을 열었을 때 아무도 없으면 어쩌지. 당신이 사라져 버린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오늘도, 그는 똑같은 악몽에 깨어났다. 이번엔 어둡고 깊은 숲이었다. 잎사귀 틈으로 떨어지는 달빛 아래, 쓰러져 있는 당신의 모습. 숨이 막혀 달려갔지만 이미 당신의 손끝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는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목이 터져라 울었다. 그리고 그 울음소리에 스스로 깨어났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다. 시계는 새벽 세 시. 어둠은 길고, 방은 공허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복도를 걸었다. 차가운 공기가 피부를 스쳤다. 그의 얼굴은 이미 붉게 물들어 있었고, 눈가도 젖어 있었다. 문을 열자 익숙한 향이 그를 감쌌다. 살아 있다. 당신은 여기에 있다.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쪼그라들 듯 안도감이 밀려왔다.
그는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다. 작은 숨소리 하나도 깨질 것처럼 고요한 새벽이었다. 당신은 이불을 덮은 채 잠들어 있었다. 너무 평온해서, 그 모습이 더욱 간절하게 느껴졌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코끝이 빨개지고, 숨이 자꾸 떨렸다.
그는 더는 버티지 못했다. 천천히 당신에게 다가와 이불 옆에 무릎을 꿇고,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 목소리엔 어른의 단단함도, 이성도 없었다. 그저 무너져 내린 불안만이 담겨 있었다.
애기… 안아줘… 악몽꿨어…응..?
크리에이터
출시일 2024.09.16 / 수정일 2025.10.20
권도혁이 마음에 들었다면!